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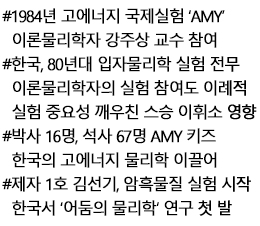
1980년대에 한국 고에너지 물리학 실험이 출발했던 지점에는 한 미국인이 보인다. 당시 미국 로체스터대학 물리학과 교수였던 스티븐 올슨이다.
올슨 교수는 1982년 1년간 일본 츠쿠바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츠쿠바에는 일본 문부성 산하의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KEK)가 있었다. KEK는 당시 새로운 입자가속기를 짓고 있었다. 트리스탄(TRISTAN)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속기였다. 전자(e⁻)와,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e⁺)를 충돌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분석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트리스탄 가속기의 건설목적은 톱 쿼크라는 입자와 무거운 경입자를 찾는 것이었다. <관련 논문 보기>
스티븐 올슨은 입자물리학 실험가. 당시 KEK에는 외국인 물리학자가 딱 세 명 있었다. 폐쇄적인 일본 문화도 그렇고, 당시 고에너지 실험 분야에서 일본은 국제실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이들 서양인은 가깝게 지냈고, 오다가다 낯선 서양인을 보면 자기를 먼저 소개하곤 했다.
스티븐 올슨은 교수 신분이었고, 그와 가깝게 지낸 또 한 명의 미국인은 스티븐 스네처(Stephen Schnetzer) 박사였다. 스네처는 UC(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에서 전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박사후연구원) 신분으로 PS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트리스탄 가속기 건설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걸 KEK에서 추진해 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트리스탄 가속기에 새로운 입자실험을 제안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트리스탄 가속기를 갖고 하는 주요 입자 검출 실험이 2개가 추진되고 있었다. 비너스 실험(1986~1995년), 토파즈 실험이다. 이 두 개의 실험은 일본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토파즈 실험은 도쿄대, 비너스 실험은 도호쿠대학 등 비(非)도쿄대가 각각 그룹을 만들어 검출기 개발에 나서고 있었다. 이들 실험은 1983년 5월에 공식으로 승인됐다.
스티븐 올슨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되, 외국의 고에너지 물리학자가 참여하는 국제실험 방식으로 하자고 연구소 측에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고에너지 실험을 국제실험으로 해본 적이 없어, 약간 당황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KEK측이 관심을 보이자, 스티븐 올슨은 국제실험을 성사시키고자 몸이 달았다. AMY(‘에이미’라고 발음한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국제실험 출범에는 일본과 가까운 중국·한국 물리학자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쪽에서 일이 먼저 풀렸다. 미국인 포닥인 스티븐 스네처 박사가 1983년 가을 베이징 여행을 갔다가 뜻밖의 낭보를 갖고 왔다. 스네처는 베이징에서 중국과학원고능(高能)물리연구소(IHEP)를 무작정 찾아갔다. 이 연구소는 중국 고에너지 연구의 중심지다.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자금성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에 있다.
스네처는 정문 수위에게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고 싶다고 우겼다. 낯선 백인의 돌발 행동에 놀란 수위는 연구소 안으로 연락을 했고, 그때 정문으로 달려 나온 사람이 정즈펑(鄭志鵬, 당시 43세) 박사였다. 스네처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캘리포니아공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UC 버클리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다. 정 박사는 스네처를 연구소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내부 구경이 끝날 때쯤 정즈펑 박사는 스내처가 얘기하는 AMY실험에 관심을 보였다. 스네츠의 제안에 정 박사도 참여하기로 했다. 정즈펑 박사는 훗날 중국 고에너지 학계의 거물이 된다. IHEP 소장으로 일하게 되며 광시(廣西)대학 총장, 중국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스티븐 올슨은 중국에서 공동연구자(collaborator)를 얻는 데 성공하자, 자신감을 갖고 KEK측에 AMY실험을 제안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동연구자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1983년 말에 찾았다. 스티븐 올슨은 그때 일본에서 1년간의 연구년을 마치고 로체스터대학에 돌아가 있었다. 로체스터대학은 뉴욕 주 북부 도시 로체스터에 있다.
어느 날 그는 고려대 물리학과의 강주상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전해 들었다. 얘기를 해준 사람은 KEK의 트리스탄 가속기 건설을 책임지고 있던 일본계 미국인 오자키 사토시 박사(2017년 사망)였다.
※Stephan L. Olsen, “Internationalizing KEK: The Early Days,” KEK News Vol.6 No.1(December 2002).
오자키 박사는 올슨에게 AMY실험 공동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학자로 강주상 고려대 교수를 추천했다. 스티븐 올슨은 강 교수의 영문 이름을 받자마자 곧바로 연구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로체스터대학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시아계 학생을 찾았다. 그들을 볼 때마다 “Are You Korean?”이라고 물었다. 마침내 그의 질문에 “Yes”라고 말하는 학생을 찾았다. 그 학생에게 올슨 교수는 “Call this number!”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강주상 교수의 대학 연구실 전화번호를 줬다.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국제전화 사정이 좋지 않았다. 올슨 교수는 “주 깽(Joo Kang)을 바꿔 달라”라고 말했다. ‘주’는 강주상(Joo Sang Kang)의 영어식 이름 가운데 first name이었고, Gang은 ‘강’씨의 영어 표현이었으나 ‘깽’이라고 올슨은 발음했다.
※양운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전해주는 에피소드다. 양 교수는 고려대 물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때 강주상 교수로부터 배웠다.
※김선기, <정목 강주상 교수 추모 심포지엄을 마치며>, “물리학과 첨단기술” 2018년 3월호, 50~52쪽.
스티븐 올슨은 강주상과 통화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984년 1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고려대 캠퍼스를 찾아가 강주상에게 자신의 AMY실험 구상을 설명했다. 올슨의 열띤 설명에 강 교수는 실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중국·한국의 물리학자가 참여한다고 하자 일본 KEK측은 AMY실험을 공식 승인했다. 비너스 실험과 토파즈 실험이 승인된 지 6개월 뒤의 일이었다. 나중에 스티븐 올슨은 ‘중국 학자, 그리고 강주상 교수를 공동연구자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AMY실험이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한국 고에너지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강주상 교수가 AMY실험에 참여하기로 했던 당시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이렇다 할 입자물리학 실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입자가속기를 설치하고, 가속기 충돌을 하는 고에너지 실험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험시설이 부족해 입자물리학자와 핵물리학자는 좌절만 하고 있었다. 우주선 핵건판(核乾板, nuclear emulsion) 실험을 하는 연구자가 그나마 입자물리 실험을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AMY실험이 1984년 출범하면서 스티븐 올슨은 대표(spokesperson)로 일하게 됐고, 실험은 1995년까지 계속된다. AMY실험에서 배출된 고에너지 실험물리학자들이 한국의 고에너지 실험을 이끌게 된다. 이들은 ‘AMY 키즈’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들을 길러낸 게 강주상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강주상은 실험물리학자가 아니라, 이론 입자물리학자였다. 그는 왜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강주상 교수(1941~2017년)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토니브룩-뉴욕주립대학에서 197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지도교수가 당시 스토니브룩-뉴욕주립대학의 교수이던 이휘소(1935~1977년)다. 스승 이휘소는 이론물리학자로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입자물리학계에서 이름이 드높았다. 이론물리학자의 논문 지도를 받은 만큼 강주상도 당연히 이론물리학 연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주상은 이후 9년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1981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 귀국했다. 고려대에 와서도 이론 입자물리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의 이론 강의는 명쾌해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다.
그가 쓴 책 <수리물리학>, <양자물리학>은 학생들이 한 권씩 갖고 있을 정도였고, 스승은 작고했지만 제자들 중에는 지금도 서가에 책을 꽂아둔 사람이 있다. 또 알라딘과 같은 인터넷서점에서 여전히 그가 쓴 책들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물리학계에선 ‘이론을 하는 물리학자가 실험 물리학자보다 공부를 잘했다’라는 신화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강주상 교수로부터 배운 고려대 출신의 한 제자는 “강주상 교수님은 머리가 컸다. 멀리서 보면 머리가 좋은 아톰 박사처럼 보였다”라고 내게 말한 바 있다.
강주상은 1984년 3월 고려대 동료교수 두 명과 일본 KEK를 찾았다. 고려대 교수로 부임한지 3년이 지났을 때였다. 강주상의 제자인 김선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는 “강 교수님이 실험물리학자인 김종오 교수, 심광숙 교수(핵물리학)와 셋이서 츠쿠바에 다녀왔다”라고 당시를 전한다. 김종오 교수는 KEK의 토파즈 입자실험에 참여하려 했지만, 츠쿠바에 가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론 입자물리학자인 강주상은 의외의 결과물을 갖고 귀국했다. AMY실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주상은 1985년에 졸업할 석사과정 학생 세 명을 불렀다. 그들에게 일본 KEK의 AMY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참여 의사를 물었다. 강주상이 부른 학생은 박일흥(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김선기(서울대 교수), 명성숙이었다. 이들은 모두 AMY실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원 석사까지는 이론을 공부했고, 박사과정도 이론으로 공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스승의 실험 참여 결정으로 진로가 확 바뀐 것이다. 김선기 서울대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국 유학을 가거나 카이스트에 가서 이론으로 박사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주상은 1985년부터 일본 AMY실험에 자신이 지도하는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 대학의 물리학자가 해외 입자물리 실험에 참여하고, 자기와 같이 연구할 대학원생을 체계적으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AMY실험은 1995년 12월, 트리스탄 가속기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강주상은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의 실험에도 참여해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테바트론’이라는 이름의 입자충돌기를 갖고 하는 D제로 입자검출 실험에도 학생을 보냈다.
또한 페르미연구소의 E687, FOCUS 실험에도 참여했다. 그는 다시 KEK의 벨(BELLE) 실험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해외 고에너지 물리 실험에 잇달아 참여함으로써 한국 고에너지 물리실험의 연구 수준을 크게 높였다.
강주상의 제자들이 그의 2006년 고려대 교수 퇴임을 맞아 펴낸 <정목집: 강주상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에 따르면, 강주상은 퇴임할 때까지 박사 16명, 석사 67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입자물리학 실험을 이끄는 대들보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고에너지 물리학 실험이 고려대 강주상 교수로부터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기록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이 2005년에 펴낸 <한국의 학술연구: 물리학>에선 강주상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2000년대의 (한국 물리학회) 입자물리학분과회 논문발표회장은 예전에 비하여 무게 중심이 이론보다 실험에 쏠리고 있다. 실험 분야에는 실력 있는 입자물리학자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한 업적을 내면서 국제실험그룹에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인적자원이 많이 몰리는 편이다. 실험 분야의 논문발표회장은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반면에 이론분야의 논문발표회장은 그에 비하여 활기가 떨어지고 참가자들의 열기도 부족하다.
실험 분야의 발표회장은 국제적 실험 그룹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이 최신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아마도 고려대 강주상이 이끈 팀이 일본 KEK의 AMY 실험을 수행한 것이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적 실험 그룹에 정규 멤버로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강주상은 왜 실험물리학 연구를 시작했을까? 입자물리학자면 입자물리학자이지, 이론과 실험이 뭐가 그리 다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문과 출신인 나도 이 부분 역시 깜깜이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그룹은 분화되어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론가는 연필을 쥐고 종이를 놓고 계산을 하는 이미지를 뿜어내며, 실험가는 장비를 들고 머리에 안전장비를 쓰고 일하는 분위기다. 두 개를 같이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강주상이 이론물리학에서 실험물리학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한 배경엔 스승 이휘소의 아우라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강주상은 이휘소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인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휘소 평전>을 쓴 바 있다. 이휘소 박사는 1977년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이 박정희 정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이휘소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김진명 작가의 1993년 작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런 예다.
강주상의 <이휘소 평전>을 보면 이론물리학자인 이휘소가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나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주상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
이휘소는 스토니브룩 대학 물리학과 교수(1966~1973년 9월)로 일하다가 강주상이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해에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1967년에 문을 연 페르미연구소는 당시 세계 최대의 입자가속기인 테바트론을 2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간 세계 입자물리 실험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었다. 이휘소는 페르미연구소가 새로 만든 자리인 ‘이론물리부장’이란 자리를 받아들였다.
이휘소가 페르미연구소로 직장을 옮긴 건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이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강주상은 회고했다. (※강주상, <이휘소 평전>, 사이언스북스, 2017, p226)
강주상은 <이휘소 평전>에서 이휘소의 그런 행동을 설명하며, 전설적인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1938년 노벨물리학상, 1901~1954년)를 떠올렸다. 페르미는 이론물리학자이자 실험물리학자인 마지막 고에너지물리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강주상은 그 자신, 실험물리학을 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바로 거머쥐었다. 그건 개인 차원을 넘어, 한국 고에너지 물리학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강주상은 훗날 1985년에 내렸던 자신의 AMY실험 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에서 국제실험에 학생을 파견한 건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국 고에너지 물리학으로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강주상의 미국 잡지 ‘SYMMETRT’ 인터뷰에서)
그리고 강주상의 제1호 박사 제자인 김선기 서울대 교수가 나중에 한국 암흑물질 실험을, KIMS라는 이름으로 1997년 시작한다. KIMS실험으로 한국도 21세기 입자물리학의 주제인 ‘어둠의 물리학’ 연구의 첫 발을 겨우 뗄 수 있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작 직전이었다.
최준석 과학 작가/주간조선 선임기자
<나는 과학책으로 세상을 다시 배웠다>(2019년)를 썼다. 과학책을 읽다가 과학책에 빠져 과학책을 썼다. 그래서 과학 작가가 되었다. 30여 년간 신문사 기자, 주간지 편집장으로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