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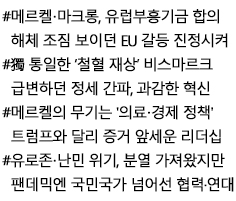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COMVID-19) 재난이 난민 문제, 국가 간 격차와 불화,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등 여러 난제로 해체 조짐마저 보이는 유럽연합(EU)을 다시 통합강화 쪽으로 방향을 돌려놨다.
이런 방향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메르켈은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5000억 유로(약 683조원)의 유럽부흥기금(European recovery fund) 조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유럽통합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 논평하고 분석하는 비영리 국제 미디어조직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6월 1일의 기획기사 ‘The Prehistory of Merkel’s Latest Coup‘에서 “메르켈의 쿠데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유럽통합 노력을 재가동한 메르켈 총리의 쿠데타를 19세기 후반의 프로이센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 작업에 비기면서, 독일통일 완수(1871년)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군비 확장과 전쟁 불사 정책)’ 덕이었지만, 지금의 유럽통합 엔진은 코로나19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메르켈 총리의 의료 및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5000억 유로의 유럽부흥기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EU 회원국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돈을 빌린 나라들이 상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원래 메르켈 총리는 보조금 무상지원에 반대했다. 무상이 아니라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EU 회원국들은 각자 처지에 따라 이 문제로 갈라져 다투고 있다.
북유럽의 ‘(아껴 쓰는 부자) 짠돌이 4인방’은 여전히 부흥기금을 ‘상환해야 할 대출금’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4인방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이다. 반면 이들로부터 ‘(팔자 좋게 놀며) 흥청망청 쓴다’는 비난을 들어온 남유럽 국가, 즉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은 부흥기금 조성을 환영하면서, EU 출범 이후 남유럽의 부(富)를 빨아들인 북유럽이 코로나19 위기처럼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들 간에 상호 불신의 골은 너무 깊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EU 경제력(GDP 기준)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경제대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존 입장을 바꿔 보조금 무상지원에 찬성한 것이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사를 쓴 프린스턴대학 교수 해럴드 제임스(Harold James)는 이를 두고 ‘부채 문제, 유로존 위기, 난민 대량 유입, 대외정책 위기 등 중첩된 기존 난제들도 뚫지 못했던 EU 통합의 돌파구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뚫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교수는 영국 태생의 경제사가로, 독일과 유럽 경제사를 전공했다.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탈EU 조짐이 뚜렷해진 남유럽 국가들을 유럽통합 쪽으로 돌려 놓는 데 코로나19 위기와 5000억 유로의 보조금 카드를 활용했다. 결국 메르켈의 유럽통합 강화 노선이 승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르켈 총리는 ‘EU의 해체는 곧 유럽의 몰락이자 독일의 파산’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는 개별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본다.
같은 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또 다른 기사 ‘Europe’s Non-Hamiltonian Muddle‘를 기고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EU와 유로(EURO)의 해체가 가속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어설픈 대처로는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에서 다른 주요 경쟁 상대인 미국, 중국, 인도 등에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럴드 제임스는 미국, 브라질 등에서 코로나19 희생자가 많은 것은 그들 나라의 정부가 무능하고 이념적이며 자기 조절 능력이 없고, 정치를 감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가 그들 나라보다 나은 것은 집권자들이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비스마르크가 독일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신성로마제국 체제 아래 수많은 독립적 군소 영방(領邦, states)들이 존재했던 독일에선 당시 급속히 확장되고 있던 시장과 무역, 새로운 통신과 운송방식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과감한 제도 혁신과 영방 통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리더가 바로 비스마르크였다.
미국과 브라질,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실패한 것도 오랫동안 누려온 기득권 유지에 골몰해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에 해럴드 제임스 교수가 쓴 기고문 전문(全文)의 대강을 옮겨 덧붙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앙의 조짐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가 5000억 유로의 유럽부흥기금 조성에 동의한 것은, COVID-19 팬데믹이 최근의 부채, 난민, 그리고 대외정책 위기들로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유럽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의 출범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시사한다. 장기집권 중인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놀랄 만한 능력자임을 거듭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일을 해냈다.
2010년에 메르켈은 IMF가 그리스 구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대를 저버렸다. 2011년 이후,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들을 폐쇄했다. 2015년엔 10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독일 국경을 개방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부흥공동기금 조성 제안에 동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독일 내에서 분노의 아우성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지나치게 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기를 꺼리는 다른 EU 회원국들을 크게 긴장시켰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메르켈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대담무쌍했던 것은 이번의 놀라운 결정에서였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별 국민국가(nation-state) 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다.
유럽부흥기금 전망에 대해 많은 관찰자들은 그것이 결국 “해밀턴 모멘트(Hamiltonian moment)”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 독립 초창기에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정부가 독립전쟁 기간에 모든 주(州)들이 지게 된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논쟁에서 이겼는데, 당장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공동부담(debt mutualization)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위기든 닥치기만 하면 더 단단한 통합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0년 전 유로화 위기가 닥쳤을 때 통합 지지자들은 그것이 유럽 (통합)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북부와 남부 지역의 회원국들은 부채 문제를 두고 더욱 심하게 분열했다. 그 뒤 러시아와 중국은 EU 개별 회원국들을 자국 영향권에 포섭하려 유혹했고,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으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서양동맹을 거의 내다버렸다.
부채와 난민 위기처럼 이런 지정학적 사태 전개는 유럽의 북부-남부 간에, 그리고 동서 간에 분열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과감한 추진을 가능케 해줄 핵심적인 역사적 조건은 늘 갖춰지지 못했다.
그러면, COVID-19가 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 브렉시트, 그리고 이전의 부채로 인한 불화가 해낼 수 없었던 일을 EU에서 해낼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까.
지금의 위기가 그런 위기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팬데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가 낳은 위기여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로 국가와 지역들 간의 감염률과 사망률 비교, 그리고 팬데믹이 야기한 엄청난 깊이와 규모의 경제적 퇴보가 일반대중을 위한 유능한 통치(거버넌스)에 프리미엄을 얹어주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이 왜 그토록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냈는지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 국가는 무능하고, 이념적이며, 자기조절이 되지 않는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와는 달리 메르켈과 마크롱은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를 구사할 의향이 없다. 그와 반대로 메르켈과 마크롱은 증거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숙련된 관리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에서 도출된 증거는 지금 위기에 대처하는데 국민국가의 대비 태세가 정말로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대응” 문제는 이탈리아처럼 19세기 내셔널리즘의 산물인 독일에서 특히 절실하다. 비스마르크(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카밀로 카부르) 이전에, 우리가 지금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수많은 작은 영방들로 구성돼 있었다. 영방들은 각기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시장과 무역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통신·운송이 확대돼가던 세계가 야기한 기술적, 경제적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작은 영방들이 통합됐을 때, 자유주의 저널리스트 루드비히 아우구스트 폰 로쇼는 그것이 영혼의 공감(sympathy of souls) 덕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의 결과라고 봤다.
달리 말하면, 국민국가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이전에 그 지역(신성로마제국)에는 3000~4000개를 헤아리는 독립된 지역단위들이 존재했는데, 그 대부분은 느슨한 제국의 관할권 아래 있었다. 18세기까지 그 수는 300~400개 정도로 줄었고, 1815년 이후 모든 영방들은 독일연방(German Confederation) 소속이었다. 19세기 말에는 독일어를 쓰는 많은 인구를 지닌 세 개의 나라만 남았는데,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스위스 연방이 그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중부유럽의 영방 수는 매 세기 남짓 기간마다 10분의 1로 줄었다. 이것이 중부유럽에 곧 0.3개의 국가만 남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역사는 수학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낡은 국민국가들로 하여금 세계 속의 자기 위상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사실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더 깊은 차원의 EU 통합으로 몰아가는 마지막 압박에 해당한다. 비록 그 판결이 명목상으로는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가 유럽중앙은행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제한했지만, 그것이 유럽 프로젝트를 막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유럽 프로젝트를 지탱해줄 법률적,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헌법 중에서 독일 헌법보다 유럽의 이상을 더 중시하는 것은 없다. 1949년 기본법은 독일 국민들이 “통합된 유럽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세계평화를 증진하겠다는 결의에 고무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24조가 유럽의 “평화롭고 영속적인 질서”를 위해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에 국민국가들은 쇠와 피로 세워졌다. 오늘날엔 의료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출되고 있다.
한승동/ 메디치미디어 기획주간

